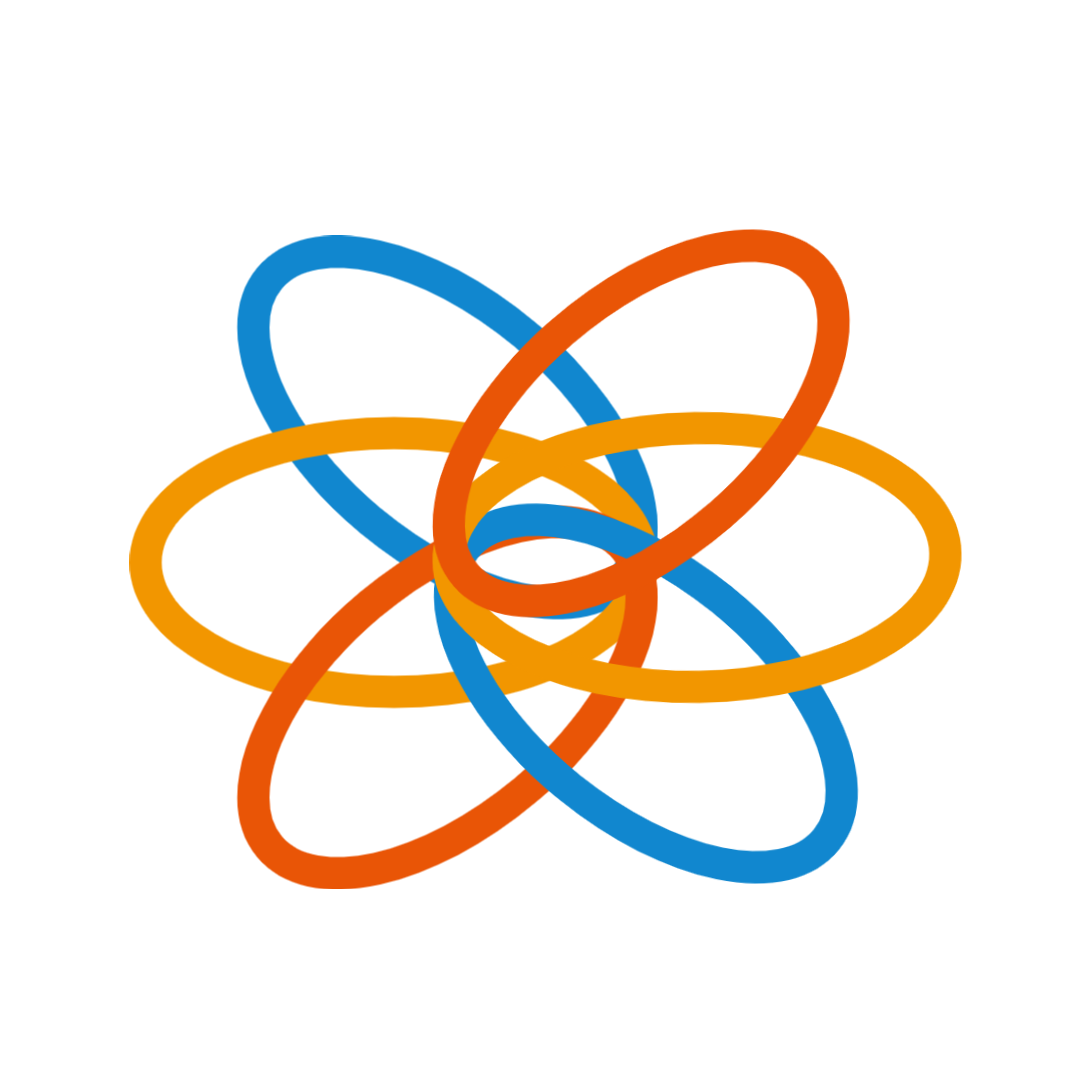초보 사장님 주목! 유동 인구만 믿다가 실패하는 이유
초보 사장님 주목! 유동 인구만 믿다가 실패하는 이유
요즘 누구나 한 번쯤 '카페 창업'을 꿈꾼다. 하지만 성공하는 카페와 조용히 사라지는 카페의 차이는 무엇일까? 단순히 인테리어가 예뻐서도, 커피 맛이 좋아서도 아니다.진짜 핵심은 바로 **'유동 인구'와 '테이블 회전율'**에 있다.이번 글에서는 카페 상권 분석에서 유동 인구와 테이블 회전율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실제 데이터 기반으로 전문적으로 분석해 본다.중간중간, 나 역시 예전에 창업을 고민하며 느꼈던 생각과 소회를 함께 풀어볼 예정이다.유동 인구가 카페 매출에 미치는 기본적인 영향🔹 유동 인구란 무엇인가?'유동 인구'는 단순히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를 의미하지 않는다.실질적으로 카페의 문을 열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규모를 의미한다.출퇴근 시간대 유동 인구주말과 평일 패턴 차이관광..
 "우비 입고 배달했더니, 데이터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비 입고 배달했더니, 데이터도 고개를 끄덕였다"
최근 몇 년간 배달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고, 특히 '날씨'가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흔히 "비 오는 날은 배달 매출이 더 잘 나온다"는 말이 있지만, 과연 데이터로도 이를 입증할 수 있을까?이번 글에서는 날씨와 배달 매출의 관계를 실제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살펴보고, 나의 개인적인 경험도 곁들여 이야기해 본다.날씨와 소비 패턴 – 기본적인 상관관계🔹 비와 소비 행동의 심리적 변화날씨는 우리의 일상 소비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외출이 불편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배달 음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미국 기상청(NWS)과 여러 상업 리서치 기관의 조사에서도, 강수량이 1mm 증가할 때 배달 매출이 평균 3~5% 상승하는 경향이 확..
 편의점 매출은 어느 요일에 가장 높을까? – POS 데이터 기반 분석
편의점 매출은 어느 요일에 가장 높을까? – POS 데이터 기반 분석
편의점은 일주일 내내 24시간 운영되지만, 매출은 균등하지 않다. ‘어느 요일에 가장 많이 팔릴까?’라는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실제로 운영 전략, 발주 시스템, 인력 배치 등과 직결되는 중요한 포인트다. 본 글에서는 POS(Point of Sale) 데이터 기반으로 요일별 매출 패턴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탐색해 보며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하고자 한다.예전에 단기 아르바이트로 편의점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엔 금요일과 토요일이 가장 바쁘게 느껴졌지만, 실제 매출 수치로 본 적은 없다. 이번 분석은 그런 기억과 현실 데이터의 차이를 검증해보고자 하는 작은 동기에서 시작됐다. 📅 데이터로 본 요일별 매출 추이PO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편의점 매출은 요일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다. ..
 우리 동네 부동산, 3년간 시세 변화를 지도에 시각화해봤다
우리 동네 부동산, 3년간 시세 변화를 지도에 시각화해봤다
부동산 시세, 감이 아닌 데이터로 보는 시대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았다. 특히 내가 살고 있는 서울 외곽 A지역은 개발 호재와 함께 시세가 요동쳤는데, 체감만으로는 변화가 얼마나 컸는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궁금했다.‘진짜 3년 전보다 얼마나 올랐을까? 그리고 우리 동네 안에서도 어느 지역이 더 크게 변했을까?’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오픈API와 카카오맵 지역 좌표 데이터, 그리고 구글 시트 기반 시각화 도구를 활용해 실제 아파트 시세 데이터를 지도 위에 올려봤다.가장 흥미로웠던 건, 같은 행정동 내에서도 단지별 시세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진다는 점이었다. 지도 위의 색상으로 표현하니 체감이 아닌 '객관적인 인식'이 생겼다. '오른 것 같아'가 아닌,..
 재생에너지 100%, 기업은 왜 이걸 약속할까?
재생에너지 100%, 기업은 왜 이걸 약속할까?
기후 위기의 시대, 기업의 책임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글로벌 시장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생존을 위한 기준이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에너지 전환은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전 세계 유수 기업들이 참여하는 ‘RE100 캠페인’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지속가능경영의 상징이 되고 있다.이 글에서는 RE100 캠페인의 개념과 참여 방식, 기업에 요구되는 에너지 책임의 실제 이행 전략,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맞닥뜨린 과제와 기회를 중심으로 전문적으로 다룬다.개인적으로도 RE100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단순한 캠페인 정도로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기업이 단순히 '재생에너지 좋다'는 이미지를 내..
 "전기요금 걱정 끝?? 분산형 에너지가 온다!"
"전기요금 걱정 끝?? 분산형 에너지가 온다!"
기후 위기와 에너지 수요의 급증은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망 구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스마트 그리드’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이다. 스마트 그리드는 단순히 전기를 전달하는 네트워크를 넘어, 전력을 생산, 저장, 소비하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는 인프라다. 여기에 분산형 시스템은 태양광, ESS, 수소, 마이크로 그리드 등 지역 단위의 에너지 자립을 가능하게 한다.이 글에서는 전력망 스마트화의 핵심 기술 요소들과 함께, 에너지 분산시스템이 지닌 구조적 장점, 실현을 위한 기술적 조건, 미래 사회의 변화 가능성까지 통합적으로 살펴본다.요즘처럼 정전 걱정이 잦아질 때마다 '전기를 쓰는 사람'이 아닌 '전기를 함께 관리하는 사람..
 "감축 기술, 통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들여다보다"
"감축 기술, 통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들여다보다"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우리가 체감하는 폭염, 집중호우, 이상 기후 모두 탄소 중심의 산업화로 인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전 세계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다양한 에너지 기술을 개발해 왔다. 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탄소 포집 기술(CCUS) 등은 대표적인 감축 솔루션으로 꼽힌다.하지만 수많은 기술이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고 있다.과연 이 기술들은 실제로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을까? 아니면 탄소중립이라는 말속에 감춰진 수치 놀음일 뿐일까?나도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처음에는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 믿었다. 그런데 막상 관련 기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생각보다 단..
 "탄소를 줄이면 돈이 된다? 내가 주목한 '탄소 크레디트'의 모든 것"
"탄소를 줄이면 돈이 된다? 내가 주목한 '탄소 크레디트'의 모든 것"
지구 온난화의 심화로 인해 전 세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중 **탄소 크레디트(Carbon Credit)**은 시장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기업과 정부, 개인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도구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하지만 탄소 크레디트는 단순한 배출권 거래 개념이 아니다. 예전엔 배출권 거래라는 개념이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졌었는데, 최근 여러 기업이 실제로 탄소 크레디트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서 '환경'이 점점 '경제'가 되어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시스템은 복잡한 규제, 경제적 유인, 국제 협력의 교차점에 위치하며, 미래 에너지 시장의 생태계를 바꿀 가능성을 지닌 구조다.이번 글에서는 탄소 크레디트 거래의 작동 방식, 주요 참여자, 실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