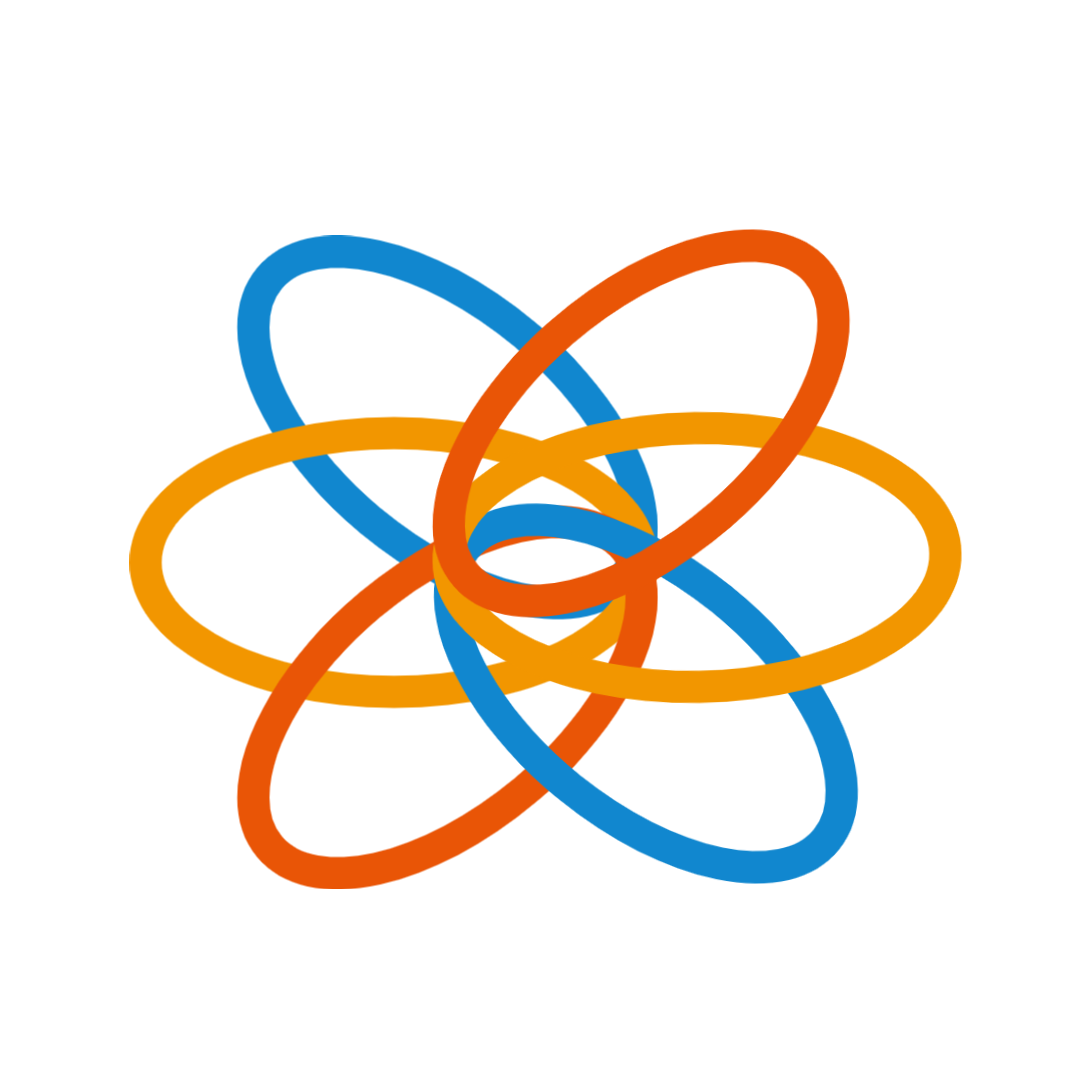티스토리 뷰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가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매일 출퇴근을 차량으로 하는 나 역시 기름값이 오르면 괜히 운전대를 잡는 게 부담스럽다. 그런데 정말로 유가가 오르면 차량 이용률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까? 혹은 실제로 유가가 내릴 때 사람들은 더 많이 차를 이용할까? 이런 질문에 데이터로 답을 해보고자 한다.

유가 변동과 주간 차량 이동량, 어떤 연관이 있을까?
국내 주요 도시의 주유소 유가 데이터를 에너지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수집했고, 차량 이동량은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의 주요 도로별 통과량 데이터를 기준으로 활용했다. 분석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로 설정해, 유가 급등기(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안정기, 하락기를 포함시켰다.
놀랍게도, 유가가 50원 이상 급등한 주차에는 평균 차량 이동량이 약 6%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일 출근 시간대(오전 7~9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주말 오후 시간대 이동량은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줄어들었다. 이는 필수 이동이 아닌 ‘선택적 외출’이 유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도 2022년 여름,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2,100원을 넘던 시기에는 주말마다 외식을 자제하고 배달앱을 더 자주 이용했다. 그땐 몰랐는데, 이렇게 다시 데이터를 보니 ‘기름값이 심리적 소비 선택에 얼마나 직접 영향을 주는지’를 체감하게 된다.
유가 하락기에는 차량 이용이 늘어날까?
반대로 유가가 안정되거나 하락세로 돌아설 경우, 차량 이용률은 어떻게 바뀔까? 2023년 하반기부터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리터당 평균 1,600원대까지 내려간 시기가 있었고, 이때의 데이터도 분석에 포함시켰다.
결과적으로 유가가 100원 이상 하락한 시점에는 평소보다 차량 통행량이 약 4%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 역시 주말 오후 시간대에 집중되었다. 단순히 기름값이 싸졌다고 해서 출근 차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었고, 오히려 ‘드라이브나 쇼핑, 나들이’처럼 여가 성격의 이동이 유가 변화에 더 예민했다.
이 대목에서 잠시 내가 잘못 생각했던 점이 떠올랐다. 유가가 내려가면 ‘전반적인’ 차량 이용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실제론 ‘선택적 소비행동’에만 변화가 있었다. 즉, 기름값이 싸다고 해도 출근이나 업무 같은 필수 이동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교통수단 선택 변화에도 영향을 주는 유가
또 하나 흥미로웠던 점은 유가 변동이 ‘대중교통 이용률’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지하철 탑승 데이터를 보면, 유가가 높았던 시기엔 차량 통행량이 줄어든 반면, 지하철 이용은 소폭 증가했다. 특히 서울 외곽 지역에서 도심으로 출근하는 노선(예: 1호선, 7호선)은 증가폭이 컸다.
즉, 차량 이용을 줄이면서도 여전히 이동해야 하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으로 전환한 것이다. 반면 택시 이용은 유가에 반응하지 않았다. 이는 택시 요금이 고정되어 있고, 이용자의 목적이 단기·편의성 중심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 결과가 가장 인상 깊었다. 나는 기름값이 비싸면 그냥 ‘덜 움직인다’는 쪽으로 생각했는데, 시민들의 이동 방식은 ‘전환’되는 것이지 ‘중단’되는 게 아니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건 사람들의 적응력이다.
차량 수요를 움직이는 것은 기름값 하나만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유가는 차량 이용에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은 부분적이고, 시간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출퇴근 시간대는 유가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이동이 유지되지만, 주말이나 여가성 외출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또한 유가가 높아질 때는 일부 이용자는 대중교통으로 이동 수단을 전환하며, 차량 운행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는 경향도 보였다. 반면 유가가 낮다고 해서 차량 이용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일은 드물었다. 결국 '유가'는 일종의 심리적 신호로서 작용하며, 즉각적인 행동 변화보다 '소비 선택의 기준'을 조절하는 요인이라는 것이 이번 분석의 결론이다.
이번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느낀 점은, 숫자는 분명한 답을 주지만 해석은 생각보다 섬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면적 변화에만 주목하면 중요한 맥락을 놓칠 수 있다. 이제는 나 역시 ‘유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차를 안 탄다’라는 단순한 전제를 버리고, 데이터가 말하는 ‘변화의 패턴’에 귀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한다.